새벽 네 시, 선풍기 소리만이 적막을 가른다.
습기가 무거운 공기 속에서 몸은 뒤척이고, 마음은 더욱 깊은 곳으로 침잠한다. 어둠이 서서히 엷어지는 시간,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 순간에 나는 혼자다.
사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기억들이 더위와 함께 떠오른다.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도, 중년에 이른 지금의 무력감도 모두 이 침묵 속에 녹아든다.
창밖으로 스며드는 미약한 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온다. 창밖의 모두는 잠들어 있지만 나만은 깨어 있다. 이것이 고독인지, 자유인지 구분할 수 없다.
한때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던 새벽이었다. 지금은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.
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. 시간은 흐르고,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.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.
동이 트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. 하지만 이 새벽의 정적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나와 마주한다. 외로움이 아닌, 고요한 성찰의 시간으로.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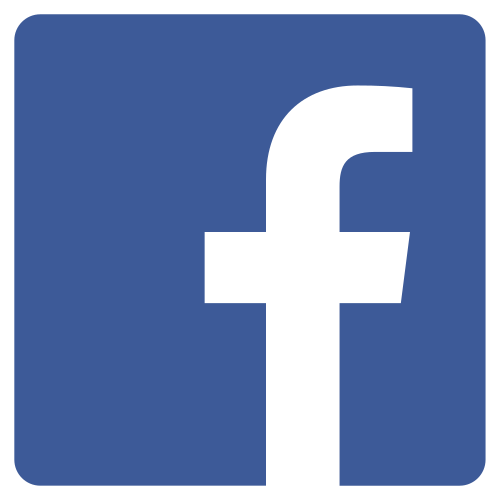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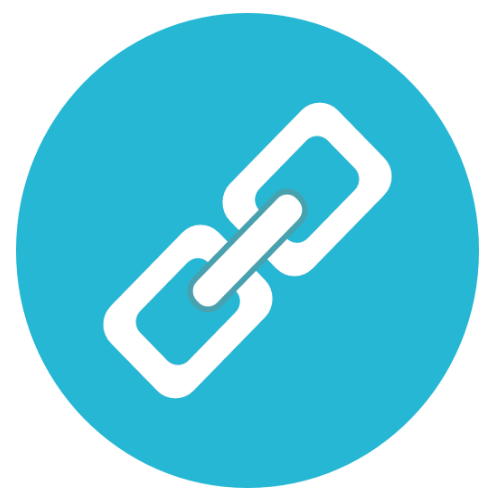
답글 남기기